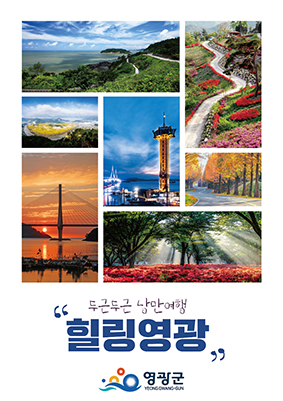[신간] 모여 살기와 공존의 감각…'정의와 도시'
한국인의 눈으로 본 근대 일본의 역사· 빛의 혁명 183
[신간] 모여 살기와 공존의 감각…'정의와 도시'
2025-07-24
▲ 정의와 도시 = 백진 지음.
일단 '정의와 도시'라는 책 제목이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성벽을 허물고 그곳에 거대한 대로(大路) '불바르'(boulevard)를 만들며 부(富)를 과시했던 '태양왕' 루이 14세의 '파리'가 정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거대한 마천루들이 즐비한 뉴욕 맨해튼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는 가난한 커플들의 입에서 정의라는 말이 쉽게 나올까.
그러나 책에 따르면 정의와 도시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어였다고 한다. 일면식 없는 이들이 모여 살며 연대가 깨지지 않고 지속되려면 정의라는 원리가 근저(根底)에 작동해야 했다. 민주주의의 요람인 아테네와 공화정을 실행한 로마의 기본 가치는 정의였다.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인 저자가 모여 살기와 공존의 감각을 일깨우는 스무 편의 이야기를 책에 담았다. 건축학을 기본으로 철학과 경제학, 역사학, 사회학을 버무렸다. 모여 살기 시작한 도시의 기원, 변모해가는 대도시의 풍경을 조명했다. 파리의 프렌치 카페, 황족과 귀족·부르주아가 대타협을 이뤄낸 빈, 그리고 서울의 이야기 등을 소개한다.
저자는 도시의 공동선과 공동체 정신을 강조한다. 그는 공동체와 공동의 선에 대한 전망을 상실한 개인들이 모여 살 때 시민들의 마음은 가난해지고, 도시는 단조로워진다고 지적한다.
"같은 계층, 성별, 가치관, 그리고 유사한 교육 및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도시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 듯 집단 내에서만 교류가 일어나기에 폐쇄회로의 집합체와 다를 바 없다."
효형출판. 446쪽.
[어크로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한국인의 눈으로 본 근대 일본의 역사 = 박훈 지음.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가 내전을 끝내고, 에도 막부(幕府·바쿠후)를 창시하자 정국이 안정됐다. 일본 도시들은 서서히 몸집을 불려 나갔다. 18세기 일본의 대도시는 인구 규모에서 세계 대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에도(지금의 도쿄)는 100만명에 이르렀고, 오사카와 교토도 각각 30만명을 넘었다. 비슷한 시기 베이징이 100만명 정도였고, 런던은 65만명, 파리는 55만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인구 증가 등 외연의 확장은 내실과 함께 가지 않았다. 막부의 통치력은 점점 약화했다. 미국 군함을 이끈 페리 제독에게 손쉽게 문호를 개방한 막부의 몰락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변방 지역이었던 조슈번(長州藩·지금의 야마구치현)과 사쓰마번(薩摩藩·가고시마현)의 사무라이들이 막부 타도에 앞장섰다. 이들은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 250년 넘게 이어진 막부 시대를 끝냈다. 일본은 재빨리 서구를 모방해 발전해 나갔다. 그러나 모방은 근대화에서 그치지 않았다.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 정신을 그대로 배운 일본은 곧 이웃 국가를 탐하기 시작했다.
서울대 역사학부 교수인 저자가 일본의 근대사를 정리한 책이다. 메이지 유신 시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 패전까지 근 100년의 역사를 담았다. 저자가 각종 언론매체에 기고한 내용을 수정하고 덧붙여 책으로 펴냈다.
어크로스. 352쪽.
[갈무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빛의 혁명 183 = 조정환 지음.
12·3 비상계엄령에 저항한 시민의 움직임, 즉 '빛의 혁명'에서 발휘된 힘을 저자는 '제헌 활력'이라 부른다. 그러면서 제헌 활력을 헌정질서를 뒷받침한 실질적인 힘이자, 시민의 저항권이라고 설명한다.
사회학자인 저자는 제헌 활력이 없었다면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것이고,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대의제는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참으로 공정한 선거도 너무나 불공정한 행위 양식이다. 극히 일부인 인간-유권자들이 위임이라는 방식으로 주권을 모아 대의제 국가권력을 구성하고 그것으로 이 세계를 찬탈할 자격을 강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갈무리. 592쪽.
(끝)
기사에 대한 의견





 핫이슈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